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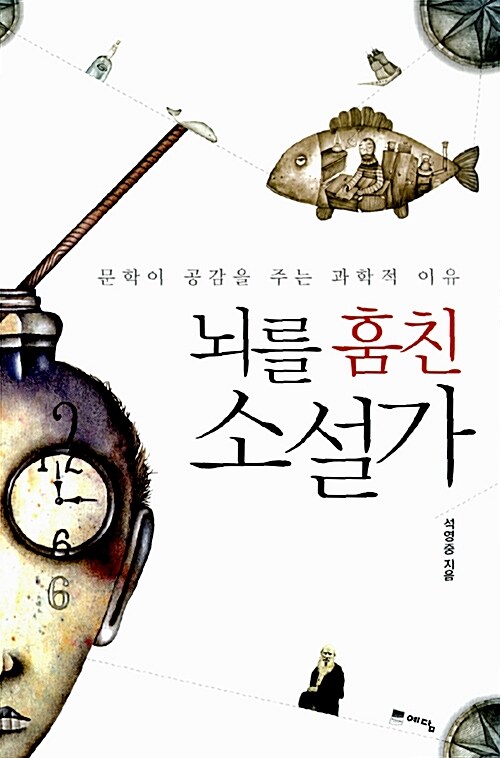
인간: 문학과 뇌과학의 접점
석영중 저, ‘뇌를 훔친 소설가’를 읽고
(책의 부제: 문학이 공감을 주는 과학적 이유)
석영중의 글쓰기는 그녀가 강연할 때 사용하는 말투가 고스란히 묻어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그녀의 글을 읽고 있으면 마치 자동 음성 지원이 되어 강연을 듣는 것만 같은 착각 속에 빠진다. 그만큼 쉽고 매끄러운 글을 쓴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러시아 문학의 정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동시에 작품을 읽고 싶게 만드는 힘까지 구사하는 작가이기도 하다. 난해하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풀어줄 수 있다는 건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여유에서 나오는 것일 테다. 배울 게 많은 교수이자 작가다.
유튜브에 올라온 몇 편의 강연을 나는 지난 2년 간 모두 챙겨봤다.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와 같은 러시아 문학 전문가로서 석영중 교수는 지금도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번역가로도, 대중 강연자로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학자다. 1991년부터 교수 생활을 했으니, 96학번인 내가 이과를 택하지 않고 중고등학교 국어, 문학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문과를 선택했더라면 아마도 나는 석영중 교수의 제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집의 경제 사정이 좋았더라면 아마도 나는 이과를 선택하지 않았을 테니까.
석영중이 쓴 도스토예프스키와 그의 작품에 대한 해설이라고 볼 수 있는 ‘도스토예프스키, 돈을 위해 펜을 들다’, 톨스토이와 그의 작품, 특히 ‘안나 카레니나’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톨스토이, 도덕에 미치다’를 읽은 나는 이미 그녀의 작품을 모두 보관함에 넣어두고 책을 구매할 때가 되면 한두 권씩 사서 보고 있다. 이 작품 ‘뇌를 훔친 소설가’도 최근에 중고로 구입한 책이다. 제목만 읽으면 금방 와닿지 않지만, 부제를 보면 무슨 내용인지 짐작을 할 수 있다. 이 책은 뇌과학 (신경과학)과 문학과의 접점을 찾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조명하여 인간을 보다 깊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지 뇌과학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이 꽤 많이 등장한다. 문학 교수로선 결코 적지 않은 공부를 병행하며 이 책을 썼으리라는 짐작을 가능케 해준다.
언뜻 보면 뇌과학과 문학은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석영중은 이 둘 간의 만남에서 접점을 찾아내고야 마는데, 그것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이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뇌과학이나 문학이나 모두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상적인 인간에 대한 정보가 아닌 인간의 내면과 본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추고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 둘은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이 책은 총 네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목만 봐도 흥미를 끈다. 각각 흉내, 몰입, 기억과 망각, 그리고 변화이다. 나에겐 첫 번째 챕터인 ‘흉내’가 가장 인상적이었기에 여기에선 이 챕터만 짧게 언급하기로 한다. 저자는 '감정이입'이라는 문학적 용어와 '거울 뉴런'이라는 뇌과학적인 용어를 연결하여 설명한다. 푸슈킨의 작품 ‘예브게니 오네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톨스토이의 ‘예술이란 무엇인가’, ‘안나 카레니나’,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등의 작품을 실례로 들며 모방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흥미진진하게 풀어준다.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대리만족 같은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 현상이 실제로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직접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아도 문학 작품 속 등장인물의 행위를 보고 마치 자기가 한 것과 똑같은 양상으로 뇌가 활성화된다는 점은 신기하기까지 하다. 감정이입은 생물학적인 현상인 셈이다. 그러나 그러한 모방의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 예컨대 베르테르가 권총으로 자살한 장면을 많은 젊은 남성들이 현실에서 재현한 사건들을 목도할 때면 문학 작품과 인간의 뇌의 상호작용을 마냥 신기해하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된다. 저자는 이런 부작용을 톨스토이가 언급했던 ‘감염’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까지 확장해서 언급하고 있다.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소 진지한 이야기까지, 한 번쯤은 생각해봄직한 논의들을 일목요연하게 펼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세 챕터 역시 비슷한 형식으로 쓰였다. ‘몰입’ 챕터에서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 허먼 멜빌의 ‘모비 딕’ 등을, ‘기억과 망각’ 챕터에서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등을, ‘변화’ 챕터에서는 톨스토이, 고골, 체호프 등의 작가들의 여러 작품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간다. 뇌과학에 문외한인 문학 교수가 쓴 책이기 때문인지 생물학적인 사실을 언급할 때보단 문학적인 장면들을 언급할 때 저자의 내공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작품이다. 그리고 나처럼 생물학을 전공하여 대충의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독자보다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독자들이 읽으면 훨씬 더 흥미롭게 읽을 것 같다.
#예담
#김영웅의책과일상
'김영웅의책과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요시다 슈이치 저, ‘파크 라이프’를 읽고 (0) | 2021.08.29 |
|---|---|
| 김소연 저, ‘마음사전’을 읽고 (0) | 2021.08.23 |
| 마커스 J. 보그 저,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를 읽고 (0) | 2021.08.21 |
| 하인리히 뵐 저,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를 읽고 (0) | 2021.08.17 |
| 가즈오 이시구로 저, ‘나를 보내지 마’를 읽고 (0) | 2021.08.10 |
- Total
- Today
- Yester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