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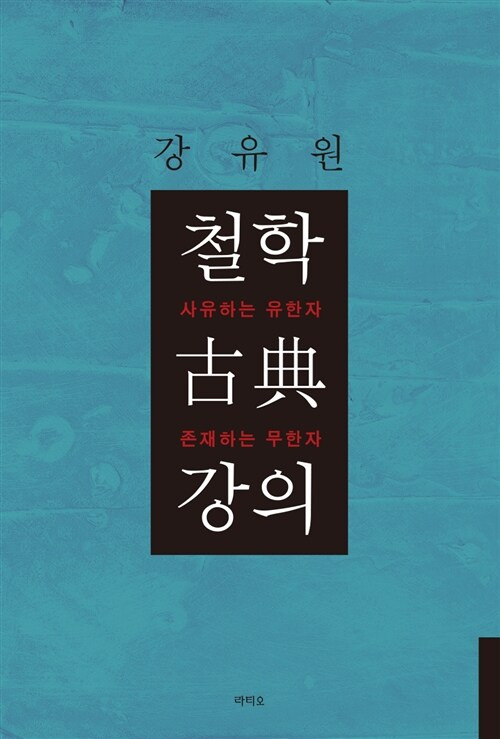
강유원 저, '철학 고전 강의' 5부를 읽고
방황하는 자
서양 근대 철학을 대표하는 데카르트, 칸트, 헤겔은 모두 인간을 주체로 내세운 자기의식에서 출발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고대 철학과 명징하게 구분되는 점이다. 데카르트는 인간을 주체로 내세우고 신을 객체로 떨어뜨렸지만 여전히 신의 존재를 상정했다. 데카르트의 자기의식이 불안한 이유다.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의심하는 나’에서 시작하는 자기의식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신으로부터 확증을 빌려와야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믿었다. 강유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카르트의 신에 대한 믿음이 어설픈 자기의식으로 표현되었다고 쓴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
칸트에서는 데카르트에서와 달리 무한자인 신과 유한자인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닫혀 있다.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신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올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그런 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 본질인지 아닌지 인간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자각하고 선을 확실히 그은 첫 철학자가 칸트였다 (이 논리는 나중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는 비트겐슈타인으로 이어진다). 인간이 가진 순수 이성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대상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먼저 존재하고 있던 대상이 보내오는 무엇인가를 인간이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의 인식 주관으로 대상 세계에서 온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구성하여 인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인식되는 대상이 중심이 아니라 인식하는 주체가 중심이라는 논리다. 대상을 객관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주관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범주로 구성하여 인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인식. 이렇게 인식하는 주체의 능동적인 역할을 전면에 내세운 칸트의 철학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불린다.
인간의 순수 이성의 한계를 명확히 그은 결과 칸트는 인간은 결코 사물 자체, 물자체를 알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인식하는 주체가 아무리 능동적이라도 그것은 주관적이라는 틀을 벗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상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가 만들어내는 인식은 저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대상은 해석하기 나름일까? 그리고 그 해석은 주체마다 다를 뿐 아니라 주체의 상황에 따라서도 언제든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본질이란 건 허상일 뿐일까? 모든 게 주관에 따른 것일까?
칸트는 정언명령에서 도덕률을 이야기한다. 어떤 목적이나 동기 없이 또는 결과와 상관없이 순수한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따르는 것이 진짜 도덕이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덕률은 선험적인 것일 텐데, 이 선험적인 것은 누가 알려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또다시 신 혹은 신에 상응하는 존재를 사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신과 같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은 결코 알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도덕적인 면에서는 그 존재로부터 온 것인 듯 보이는 어떤 선험적인 법에 따라 인간이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런 논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참고로, 기독교 변증가이자 소설가인 C. S. 루이스는 이러한 도덕률, 자연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유추해 낸다 (순전한 기독교 앞부분). 이런 면에서 강유원은 다음과 같이 쓴다. “칸트는 계속해서 고민만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나는 위에 적은 강유원의 문장으로부터 내가 이해한 칸트를 모두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판하여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도 결국 방황으로 끝나는 존재자. 나는 결국 칸트 역시 데카르트와 비슷한 결을 가진다고 느낀다. ‘방황하는 자’라는 점에서 말이다. 의심으로도,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으로도 끝내 해결하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간은 늘 그 영역을 궁금해하고 사유하고 묻게 된다는 것. 신을 배제하고 객체로 끌어내리려는 그들의 시도는 결국 신의 존재를 더욱 인정하게 되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나는 생각하게 된다. 한편, ‘방황하는 자’라는 개념이 인간이라는 존재자의 본질의 한 단면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 아닐까 하고도 생각하게 된다. 아흔아홉 개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체계를 갖추더라도 마지막 남은 하나를 설명하지 못하는 인간. 그 하나를 마저 설명하려면 아흔아홉 개를 설명했던 논리의 근원을 해체시켜야만 가능하다고 여기게 되는 인간.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미적지근한 상태로 공중에 붕 뜬 상태로 존재하는 인간. 그렇게 많이, 그렇게 깊게 사유를 거친 후에도 궁극적으로 방황이라는 상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인간. 바로 ‘방황하는 자’의 의미일 것이다. 이는 존재론적인 의미를 띤다고 나는 생각한다.
철학자들을 공부하는 게 진짜 의미 있는 이유는 그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나 논리를 이해하는 즐거움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들의 한계, 그리고 그 한계에 봉착했을 때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즐거움도 무시하지 못할 부분일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철학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된다.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숙고를 거쳤음에도 인간이라는 점 때문에 갇힐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며 한편으로는 연민도 느끼게 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인간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는 결론에도 이르게 되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런 배움은 철학만이 아니라 고전문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내게는 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철학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의미는 이러한 과정 전체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연결되는 저마다 다른 어떤 면을 깊게 숙고하며 따져보고 의심해 보며 묻고 답하는 순간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철학자들의 많은 개념과 논리는 잊히게 된다. 그러나 내가 사유했던 그 시간만큼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 그 배신하지 않을 시간들이 나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리라 믿는다. 계속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라티오
#김영웅의책과일상
* 강유원의 철학 고전 읽기
1부: https://rtmodel.tistory.com/1996
2부: https://rtmodel.tistory.com/2015
3부: https://rtmodel.tistory.com/2025
4부: https://rtmodel.tistory.com/2039
5부: https://rtmodel.tistory.com/2051
6부:
'김영웅의책과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줌파 라히리 저, '책이 입은 옷'을 읽고 (0) | 2025.10.26 |
|---|---|
| 프랑수아즈 사강 저, '패배의 신호'를 읽고 (0) | 2025.10.25 |
| 보후밀 흐라발 저, '너무 시끄러운 고독'을 다시 읽고 (1) | 2025.10.15 |
| 스콧 스미스 저, ‘심플 플랜’을 읽고 (0) | 2025.10.13 |
| 폴 오스터 저, '빵 굽는 타자기'를 읽고 (0) | 2025.10.11 |
- Total
- Today
- Yester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