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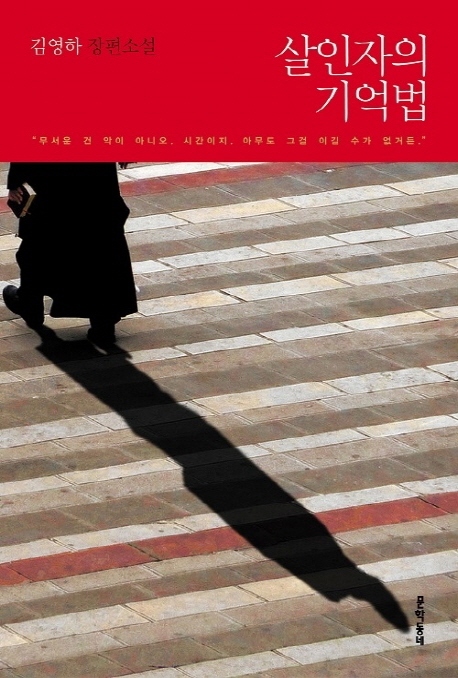
악이 아닌 악과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
김영하 저, ‘살인자의 기억법’을 읽고
정유정의 ‘종의 기원’을 읽은 직후 우연찮게 손에 든 책이 하필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니! 살인자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쓴 일기 형식이라는 점에서 두 작품은 접점을 가진다. 그러나 그 접점 말곤 전혀 다른 느낌이다. ‘종의 기원’에서는 사이코패스로 태어난 한유진이라는 젊은 남성 내면에서 악의 발현과 진화를 현재 진행형으로 현장감 있게 관찰할 수 있다면, ‘살인자의 기억법’에서는 25년 전까지 숱하게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이었던 70세 노인이 알츠하이머에 걸려 망각의 강으로 빠져드는 과정과 망상의 난잡함 속에서 허우적대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지키고 싶었던 사람을 죽이게 되는 과정을 목도할 수 있다. ‘종의 기원’이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 안에서 일하는 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살인자의 기억법’은 악보다는 그 악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사이코패스보다는 알츠하이머라는 설정이, 또한 젊은 남성보다는 노인이라는 설정이 사람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한다. 정유정과 김영하는 제각기 작품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살인자의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절묘하게 삼고 있는 것이다.
두 작품 연이어 살인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소설이라는 장치가 선사하는 유일한 장점을 다시 깨닫게 된다. 소설이 아니면 어떻게 살인자의 마음을, 끔찍하지만, 따라가며 공감까지 할 수 있겠는가 싶기 때문이다. 아무리 신학과 철학에서 악의 문제를 종교적이고 관념적으로 연구한다 하더라도 소설이 주는 생생한 현장감은 결코 흉내 내지 못할 것이다. 악은 관념으로 머물 때가 아닌 형체를 입고 발현할 때 비로소 악이라 정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발현의 통로는 사물이나 자연이 아닌 항상 인간이라는 점에서 소설은 악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임에 틀림없다. 내가 조직신학의 인간론과 신정론을 공부할 때보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읽을 때 인간의 본성과 악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 한국 소설가들의 작품을 자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읽어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 서너 편 정도씩 읽고 나면 한국 현대 소설의 흐름이 어느 정도 보일 것 같다. 정유정의 문장과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김영하의 문장들을 읽어나가는 재미도 쏠쏠하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한국 현대 소설을 읽고 나면 무언가 휑하다는 느낌에 젖는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다. 고전 문학에서 충만하게 채워지던 그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어쨌거나 언젠가는 쓰게 될 내 소설의 스타일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는 것 같아 나름 만족스럽긴 하다.
#문학동네
#김영웅의책과일상
'김영웅의책과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하인리히 뵐 저,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를 읽고 (0) | 2021.08.17 |
|---|---|
| 가즈오 이시구로 저, ‘나를 보내지 마’를 읽고 (0) | 2021.08.10 |
| 정유정 저, ‘종의 기원’을 읽고 (0) | 2021.08.02 |
| 윌리엄 트레버 저, ‘펠리시아의 여정’을 읽고 (0) | 2021.07.26 |
| 가즈오 이시구로 저, ‘클라라와 태양’을 읽고 (0) | 2021.07.19 |
- Total
- Today
- Yesterday

